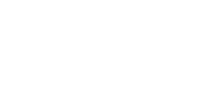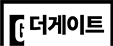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더게이트]
지난 10월 31일 국민의 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고 2017년 117건이던 교통사고 통계가 6년만에 20배나 오른 데다 무면허를 조장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다. 이미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퇴출됐다며 선진국의 예시도 들었다.
2017년 우리나라에 처음 전동킥보드 사업이 태동할 무렵 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은 혁신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2023년에는 밴처캐피탈(VC)들이 전동킥보드 업체들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성장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매출은 두배 영업이익은 3배나 됐으니 ‘리즈 시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짙었다. 김소희 의원이 말한대로 교통사고는 업계 매출만큼이나 뛰었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때마침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퇴출운동까지 벌어져 결국 시장이 나서 ‘퇴출’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름도 ‘킥라니 금지법’으로 별칭으로 붙어 대중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언론에서도 킥라니 금지법이 대표 발의된 것에 대해 알렸다. 사설로는 전동킥보드에 더 직설적인 비유도 들었다. ‘바퀴 달린 흉기’, ‘사회적 리스크’라고 칭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소희 의원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형 흉기’라 칭할 정도였으니 누가 더하고 덜한 정도가 없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목표 그리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정의와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 즉, 전동킥보드 도로 운행 자체를 금지해 우리나라에서 아예 몰아내는 것이다.
법안 발의 이후 사단법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KPMIA) 등 업계 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혁신을 막고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말 전동킥보드는 악마의 흉기인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동킥보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용자와 제도가 뒤떨어진 탓이다. 다시 말해 제도를 정비하면 될 일이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이 침투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개인의 이동성을 보완해줄 뿐 아니라 전동화 이동수단인 만큼 친환경적이다. 시장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동킥보드 시장규모는 조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연평균 10.35% 성장해 2035년에는 약 131.5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 독일자동차 회사들은 트렁크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를 더한 전동킥보드를 장착해 콘셉트카로 선보일 정도였다. 이들 역시 전동킥보드의 유용성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전동킥보드를 몰아내야 하는 것인가? 제도를 손보고 안전장비를 더하는 방향으로 성장시킬 순 없는 것인가?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가 퇴출했다면 그 반대의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일본은 2024년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법을 손봐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 분류했다. 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인 셈이다. 보행모드도 손 봐 인도에서는 6km/h 이하로 타면 된다. 업체도 호황을 누렸다. 이 분야의 1위 업체 루프(LUUP)는 23년 11월 약 36억 엔의 자금 투자를 받으면서 누계 조달액이 127억 엔에 달했고, 도쿄, 오사카 및 후쿠오카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이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환경에 관심이 높고 정부가 이미 SDGs(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추진과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에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으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46%(2013년도 대비) 삭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 목표에 더할 나위 없는 수단이다. 일본국교성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탑승자 1명을 1km 이동시키는 데 자동차의 약 40분의 1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독일은 전동킥보드의 책임보험을 의무화했고, 싱가포르는 도킹 스테이션을 마련해 충전과 무분별한 주차난을 해소했다. 기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대중들이 미워하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만들었다.
국민의 힘 김소희 의원이 내놓은 전동킥보드 퇴출안은 과연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의 방향성과는 합치하는지 그리고 관련 업계와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는지 의심스럽다. 얼마전 국회국정감사에서 더스윙 김형산 대표를 향해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한다’며 십자포화를 퍼붓던 공무원들이 생각난다. 더스윙은 현재 국내 1위 전동킥보드 회사다.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은 424억원. 전년 동기대비 70% 성장했다. 하지만 더스윙은 사업을 접는다. 전도유망한 회사가 뒤떨어진 사회제도로 인해 길을 잃은 셈이다. 무작정 퇴출만이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