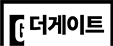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2015년, 한 마이너리거가 한국에 와서 다짐했던 건 ‘먼 훗날 빅리그 데뷔를 꼭 이루겠다’는 꿈이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다. 메이저리그(MLB) 무대를 밟는 건 물론이고, 미국 야구대표팀을 거쳐 이젠 월드시리즈 마운드까지 서게 됐다. 바로 비룡 군단 외국인 투수로 활약했던 메릴 켈리 얘기다.
창원에서 가을야구가 한창이던 10월 25일, 바다 건너 미국에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22년 만에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2년 전만 해도 정규시즌 110패로 최하위를 전전했던 팀이 화려한 반등을 선보인 것. 특히 지난 5년 동안 선발진 한 축으로 묵묵히 마운드를 지켜온 켈리의 역할이 무척 컸다.
전 SK 와이번스(SSG 랜더스의 전신) 출신인 켈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KBO리그에서 뛰었고, 그 뒤로 MLB에서 줄곧 활약 중이다. 지난 2019년 애리조나에 합류한 5년 동안 ‘한 시즌 10승’이 3차례다. 올해는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177.2이닝을 던져 12승 8패 69볼넷 187탈삼진 평균자책 3.29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켈리의 호투는 포스트시즌에서도 계속됐다. 올가을 LA 다저스,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만나 3경기 동안 2승 1패 평균자책 2.65를 기록한 것. 큰 변수가 없다면 다가올 월드시리즈에서 텍사스 레인저스 상대로 선발 등판해 자웅을 겨룰 예정.
이 때문에 그간 적지 않은 ‘KBO리그 역수출’ 사례가 있었지만, 켈리만큼은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공이 정말 지저분했다” KBO리그 역대 최다안타 ‘전설’ 박용택의 극찬

“내 기억 속 켈리는 ‘천적’이었다. 선수 생활하면서 상대하기 가장 어려웠던 오른손 투수였으니까. 주변 동료 선수들마저 ‘왜 그렇게 유독 고전하냐’고 말할 정도로 상대 전적이 좋지 않았다.”
LG 트윈스 전설이자 KBO리그 역대 최다안타(2504) 주인공인 박용택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의 말이다. 현역 시절 박 위원은 켈리와 29차례 타석에서 맞붙어 타율 0.179, 출루율 0.207, 장타율 0.250 등으로 무척 고전했다.
“켈리는 공이 정말 지저분했다”며 미소 지은 박 위원은 “스플릿성으로 휘는 속구를 의식하면서도 몸쪽 컷패스트볼부터 바깥으로 도망가는 체인지업까지, 내 입장에서 참 까다로웠던 선수”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 켈리가 2018년 SK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후로 새로운 길을 택했다. 2년 550만 달러(당시 한화 약 62억 원 상당)의 계약으로 MLB로 향한 것. 그전까지 MLB 경력이 아예 없었던 켈리에겐 ‘금의환향’과도 같았던 이야기가 펼쳐진 셈이다.
“브룩스 레일리(전 롯데·현 뉴욕 메츠) 때도 그랬는데, 그에 앞서 켈리가 미국에 갈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 친구는 빅리그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고.”
박 위원의 예상은 현실이 됐다. 레일리는 좌타자 한두 명을 막기 위한 ‘루기’(LOOGY·Lefty One-Out GuY) 역할을 극복하고 MLB 대표 좌완 불펜으로 거듭났고, 켈리 역시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르는 선발 투수가 됐다.
켈리는 “이러한 성공 뒤엔 KBO리그가 있었다”고 종종 말해왔다. 2018년 12월, 애리조나 이적이 성사된 뒤 MLB.com의 Cut4를 통한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이때 켈리는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켈리는 “미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우의 기억 속 켈리 “MLB 데뷔에 대한 꿈이 무척 강했던 선수”

한국에 온 켈리는 성공과 발전에 목말랐다. 포수 출신인 이성우 SPOTV 해설위원 역시 그 열정을 기억하는 이다. 이 위원은 현역 시절 켈리와 많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년 동안 2,000구가 넘는 공을 받았다.
프로에서 포수로만 14년을 뛴 이 위원은 “내로라하는 외국인 투수 가운데서 켈리의 공은 단연 최고였다”고 말한다.
다만 이 위원이 주목한 건 공의 위력뿐만이 아니었다.
“한때는 시즌 도중인데, 갑자기 각이 큰 슬라이더를 던지기 시작하더라. 전에 없던 구종이었는데, 또 그게 후반기부터 쏠쏠한 재미를 봤다.” 이 위원이 2017년을 떠올리며 꺼낸 일화다.
참고로 켈리는 빅리그 5년차인 올해도 해당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다. 美 야구통계사이트 ‘베이스볼서번트’에 따르면 구사율은 5.5%로 가장 적지만, 피안타율이 0.217로 효율적인 구종이다.
이 위원 기억 속 켈리는 여타 외국인 투수들과 약간 달랐다. 자신의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변화를 택할 줄 아는 선수였다. 그런 켈리의 유연성을 강조한 이 위원은 “(켈리는) 마운드를 내려와서도 KBO리그 타자 공부를 많이 했다”며 “마운드 위에서 항상 포수들과 소통하면서 그날 컨디션, 몸이라든지 공 상태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영리함을 갖춘 선수”였다고 평가했다.
그 시절 켈리의 꿈은 훗날 MLB에 데뷔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도 “켈리가 빅리그 데뷔에 대한 열망이 어마어마했다. 늘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MLB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고 했다.
켈리는 마침내 그 꿈을 이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엔 제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미국 유니폼을 입고 결승전 무대에 올랐다. 이젠 월드시리즈 선발 등판이 목전이다.
켈리의 손엔 이미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2018년)가 있다. 그 옆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을까. 바로 월드시리즈 제패다.
한국프로야구, 그리고 미국프로야구까지 두 분야에서 모두 최정상에 오른 선수는 아직 없었다. 험난했던 등정길에서 더스틴 니퍼트(월드시리즈 준우승·한국시리즈 우승)만이 가장 가까이 다가섰을 뿐이다.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은 켈리가 펼칠 ‘가을의 전설’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