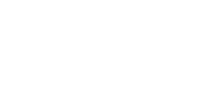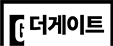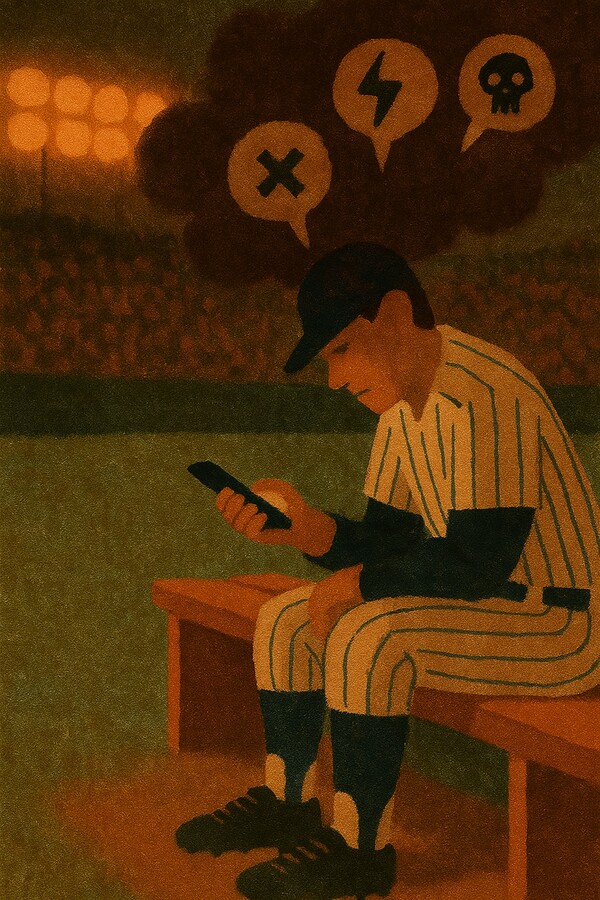
[스포츠춘추]
2021년 5월, 당시 SSG 랜더스 소속이었던 최주환(현 키움)은 원정 시리즈 맹활약 후 특정 팀 팬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부모님을 향한 모욕적인 DM"을 받았다. 최주환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이달 초, 삼성 르윈 디아즈가 자신의 SNS를 통해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 "아내는 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고, 반려견들을 독살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다"며 4년 전 최주환과 똑같은 말을 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수와 팀명, 협박 내용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그대로다. 악성 DM은 여전히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고, 대응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4년 전처럼 특정 선수가 목소리를 높이고 그때만 떠들썩하다가 다시 조용해지는 일이 되풀이됐다. KBO리그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스포츠춘추와 통화에서 "아직 악플, 악성 DM 문제와 관련해 리그 차원에서의 보호 대책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디아즈와 한화 와이스 등 연이은 피해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만약 문제가 심각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대응책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그나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선수협 관계자는 "선수들을 향한 악성 DM과 협박 문제가 심각하다"며 "4년 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을 계기로 선수협은 원하는 선수들에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선수협 고문변호사가 지원을 제공하고, 만약 법적인 대응을 원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 "아직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팬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나"라고 선수협 관계자가 털어놓았다. 지원 체계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선수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법적 대응조차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선수가 팬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부담감, 팬을 상대로 한 소송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전시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4년 전부터 소속 선수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 에이전시 관계자는 "에이전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도 결국엔 선수가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찰 출석이다. "형사고소이다 보니 본인이 무조건 한번은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겐 부담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구단이나 리그 차원에서 선수를 지원, 보호해주는 것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나마 과거처럼 법적 대응을 못하게 막지는 않는다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다. "이전에는 구단에서 선수의 법적 대응을 말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구단들도 달라져서 도를 넘는 악플에 대해 선수가 힘들어하면 법적 대응을 말리지는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다. 구단이 직접 나서서 선수를 보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개별 에이전시나 선수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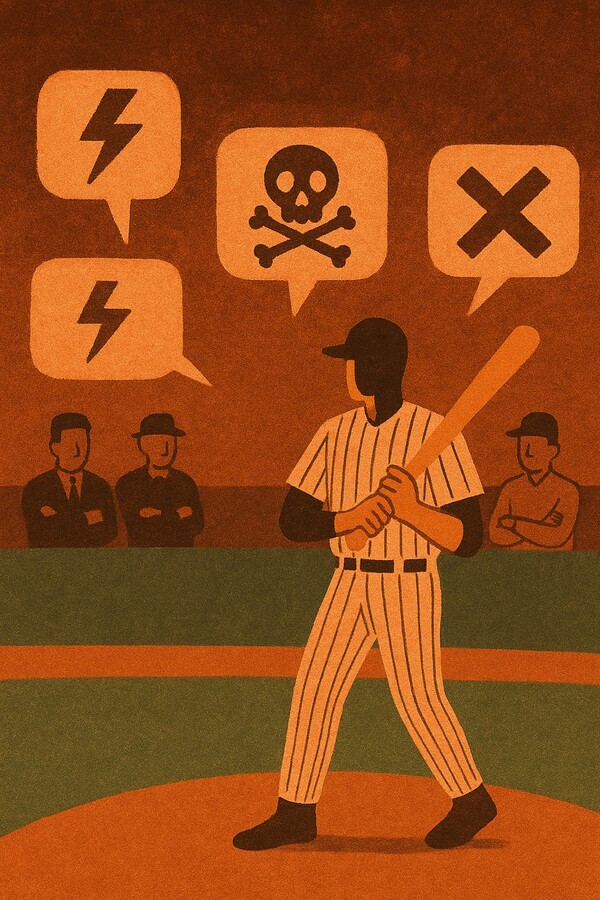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는 대조적이다. MLB는 최근 스포츠 베팅 관련 선수 대상의 욕설과 협박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담 보안팀을 개설해 선수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협박 신고 핫라인도 별도로 운영한다. 구단과 리그, 선수노조가 협력해서 선수 보호에 나서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한 야구인은 "도 넘은 악플과 협박은 인격 살인 행위이고 프로야구 리그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리그와 선수협, 구단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선수들에게 효능감 있는 대응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악성 DM과 협박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를 넘어섰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KBO 역시 에이전시나 개인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리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4년 전처럼 몇몇 선수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이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KBO와 구단들의 의무다. 그것이 KBO리그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이다. 선수 보호를 위한 KBO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