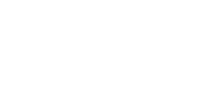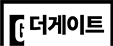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시즌 중 해임된 감독이 바로 다음 시즌 코치로 현장에 복귀한다. 과거 한국 야구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광경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23일 잠실구장에서 김원형 신임 두산 베어스 감독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함께 전해진 소식 중 눈길을 끈 이름이 하나 있었다. 홍원기 전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두산 수석코치로 합류한다는 내용이었다. 올 시즌 중반까지 키움 사령탑이었던 홍 코치가 해임 반년 만에, 그것도 코치로 현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적잖은 놀라움을 선사했다.
홍 코치는 2021년 키움 감독으로 부임해 올해 전반기까지 팀을 이끌었다. 부임 첫해 팀을 가을야구로 이끌었고 2년 차엔 한국시리즈 준우승 성과를 거뒀다. 2023년 이후 팀의 '리빌딩'을 맡았다. 최약체 전력이라 3년 연속 최하위 성적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키움 구단은 전반기가 끝난 뒤 홍 감독과 김창현 수석코치, 고형욱 단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통산 성적은 293승 15무 359패, 승률 0.449다.
공교롭게도 김원형 감독과 홍원기 코치는 2022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사이다. 당시 김원형 감독은 정규시즌 1위 SSG 사령탑으로, 홍원기 코치는 3위 키움 감독으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키움은 1차전과 4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2승 2패로 SSG를 몰아붙였다. 결국 SSG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두 사령탑은 명승부를 벌였다. 그로부터 3년, 한국시리즈 우승 감독과 준우승 감독이 한 더그아웃에서 호흡을 맞추게 됐다. 보기 드문 광경이다.

함께 경쟁하던 감독의 수석 역할을 하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홍원기 코치는 어떤 역할이든 현장에서 선수들과 호흡하고 경험을 전수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다. 홍 코치는 스포츠춘추와 인터뷰에서 "40년 넘게 유니폼을 입어와 잠옷같이 편안한 옷이 유니폼"이라며 "그런 야구 유니폼을 입고 현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했던 순간이 마냥 좋았다"라고 했다.
사실 김원형 감독도 비슷하다. 김 감독은 올해 한 인터뷰에서 굳이 감독이 아니라도 어떤 역할이든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최근까지는 한국야구 국가대표팀 투수코치로 현장 부근에서 역할을 해왔다. 감독인지 코치인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홍 코치는 웬만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지도자다. 감독 시절에도 자신을 부각하기보다는 구단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에게 항상 공을 돌렸다. 프런트 입김이 강하고 감독이 개인의 에고를 드러내기 쉽지 않은 키움 특유의 시스템 속에서 구단이 원하는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했다. 특유의 겸허함과 친화력으로 수석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는 게 홍 감독을 아는 이들의 평가다. 김원형 감독과 두산도 이런 홍 코치의 장점을 알고 수석으로 임명했을 것이다.
그간 KBO리그에서 경질당한 감독들은 좀처럼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1군 감독 출신 코치는 웬만해선 보기 어려웠다. 수직적인 야구계 문화에서 감독을 지낸 인사가 그보다 아랫급인 코치를 맡는 게 체면이 깎이는 일로, 좌천처럼 여겨진 탓이다. 구단도 감독 출신 거물을 코치로 쓰기 부담스러워했고, 일선 감독들은 감독 출신 코치를 언제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자'로 경계했다.
감독은 언젠가는 해고당하는 게 운명인 직업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감독직에 올랐다가 잘리고 나면 프로야구에 재취업하기 쉽지 않았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익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기 일쑤였다. 수많은 전직 감독들이 해설위원이나 KBO 경기운영위원으로 야구 현장 주변에서 겉돌다가 커리어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선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11명의 빅리그 감독 출신 벤치코치가 일했다. 감독에서 해고된 뒤 바로 다른 팀 벤치코치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얘기다. 브래드 아스머스는 디트로이트와 LA 에인절스 감독을 지낸 뒤 뉴욕 양키스 벤치코치로, 돈 매팅리는 LA 다저스와 마이애미 감독을 한 뒤 토론토 벤치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월트 와이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콜로라도 로키스 감독을 지낸 뒤 애틀랜타 벤치코치로 일했다.
왜 메이저리그에선 감독 출신 코치가 흔할까. 벤치코치는 감독의 오른팔이자 부관으로, 스프링 트레이닝 운영과 타격 연습 일정 관리 같은 일상 업무를 처리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전술적 경기 준비다. 감독들은 경기 중 많은 결정을 내릴 때 벤치코치와 상의하며, 경험이 많은 벤치코치는 감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감독의 비중이 정규시즌보다 커지는 단기전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감독과 코치는 상하관계나 주종관계가 아닌 '파트너'다. 감독과 코치가 각자 전문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분돼 있다. 코치로 잘한다고 다 감독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독으로 실패한 적이 있다고 코치 역량이 평가절하되지도 않는다. 코치와 감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이 인정받는 구조다.

지난해 7월 초, 양상문 한화 투수코치가 김경문 한화 감독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 복귀했을 때 한 말이 있다. "과거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유니폼 입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게 좋을 뿐이죠." 감독, 단장을 거친 지도자가 사령탑이 아닌 코치로 다시 현장에 복귀하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양 코치는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있다면, 어떤 보직이든 상관없지 않겠나"라며 껄껄 웃었다. 홍원기 코치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감독 출신이라고 반드시 다시 감독만 해야 하는 것은 편견이다. 감독도 야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역할 중 하나이고 코치 역시 마찬가지다. 홍원기 코치, 양상문 코치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한다. 감독 출신이 수석코치는 물론 투수, 타격, 수비 등 파트코치를 맡는 사례도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오래 쌓은 풍부한 경험이 사장되지 않는다. 베테랑 지도자의 노하우를 썩히는 건 야구계의 손실이다.
초보 감독을 선임했을 때는 베테랑 코치의 보좌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험 많은 코치의 조언은 동료 코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감독을 지낸 이들이 다시 코치로 현장에 복귀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진다면, KBO리그는 더욱 건강한 야구 문화를 갖추게 될 것이다. 야구계가 잘린 감독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