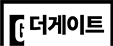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슈퍼스타 브라이스 하퍼와 욕설이 오가는 설전을 주고받아 화제가 됐던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가 나흘 만에 '별일 아니었다'며 뒤늦은 체면치레에 나섰다. 하지만 선수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다.
맨프레드는 2일(한국시간)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수 미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이 일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이스가 회의 말미에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고, 우리는 악수하고 각자 길을 갔다.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선수들의 증언은 전혀 다르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방문한 맨프레드에게 하퍼가 "연봉상한제 얘기를 하려면 클럽하우스에서 꺼져"라고 소리쳤고, 맨프레드도 "나는 여기서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닉 카스테야노스는 "정말 격렬했다. 커미셔너와 하퍼가 서로 쏘아붙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 맨프레드가 이제 와서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것 이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대인배'인 척 하는 모습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실컷 같이 욕설 공방을 해놓고 짐짓 점잖은 척 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하퍼와 맨프레드의 욕설 사태는 샐러리캡이 미국 선수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뇌관인지 보여준다. 샐러리캡 도입에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넘어간 KBO리그와 달리 메이저리그는 샐러리캡 언급만으로도 폭발적 반응이 터져 나온다. 실제로 1994~1995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장기간 파업도 구단 측의 샐러리캡 도입 시도가 발단이었다. 미국에서 샐러리캡은 그야말로 '금기어'나 다름없다.

이런 격렬한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하퍼는 드래프트 상한제의 직접적 피해를 목격한 세대다. 2010년 드래프트에서 1090만 달러를 받았던 그였지만, 2년 뒤 상한제가 도입되자 후배들의 계약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봤다. 당시 최고 계약자였던 바이런 벅스턴은 600만 달러에 그쳤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드래프트 최고액은 925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샐러리캡 자체가 선수들의 투쟁 역사와 직결돼 있다. 1970년 커트 플러드가 목숨을 걸고 싸워 만든 자유계약제도를 뒤엎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플러드의 딸 셸리는 최근 "연봉상한제는 '우리는 당신들이 받을 만한 돈을 주기 싫다'는 뜻"이라며 "아버지가 시작한 투쟁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맨프레드가 추진하는 팀 순방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노조를 우회해 선수들을 직접 설득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시작된 순방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카스테야노스의 말이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매출 168조원을 올리는 리그가 프로야구단 경영을 마치 네일샵 운영처럼 말하는 이유가 뭘까?"
맨프레드는 자신의 과거 협상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1998년 MLB에 입사한 이후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폐쇄는 없었다"며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수에게 욕까지 들은 마당에 앞으로 더 심한 일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샐러리캡이라는 초대형 폭탄 앞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26년 협약 만료까지 1년 반이 남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퍼의 격한 반응은 선수들이 연봉상한제에 대해 얼마나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됐다. 미국에서 샐러리캡을 도입하려면 선수들의 쌍욕은 기본이고, 시즌 전체를 날려버릴 각오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