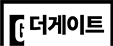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테니스가 스포츠계 스토킹 사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1993년 모니카 셀레스가 코트에서 칼에 찔린 충격적 사건 이후 3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테니스 선수들은 광적인 스토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14일(한국시간) "테니스가 왜 스포츠계 스토킹의 진원지인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테니스 선수들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조명했다.
1993년 4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벌어진 사건은 테니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다. 당시 19세였던 셀레스가 경기 중 '라이벌' 슈테피 그라프의 광적인 팬 귄터 파르헤에게 등을 칼로 찔렸다. 이 사건으로 셀레스는 2년 넘게 코트를 떠나야 했고, 결국 커리어 전성기를 잃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올해 2월 두바이 테니스 챔피언십에서 에마 라두카누는 경기 도중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을 스토킹하던 남성이 관중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6차례 그랜드슬램 우승자 이가 시비옹테크는 올해 마이애미에서 온라인 협박범이 나타나 언어폭력을 당했다.
율리아 푸틴체바는 올해 윔블던 1라운드에서 "위험하고 미친" 관중이 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며 그가 사라질 때까지 경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심리적 타격을 받은 푸틴체바는 결국 0-6, 0-6으로 참패했다.

디 애슬레틱은 테니스가 유독 스토킹의 표적이 되는 이유를 분석했다. 전 여자테니스협회(WTA)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개인 종목이라는 특성에 어린 나이, 외모, 높은 인지도까지 더해지면서 여자테니스는 스토커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테니스는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많은 여성 아이콘을 배출해왔다. 선수들의 경기 일정과 연습 일정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경비가 삼엄하지 않은 순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가장 큰 대회장에서도 코트사이드 좌석은 팬들이 선수들과 매우 가까이 앉을 수 있게 한다.
라두카누는 3년 전 자신의 집까지 37km를 쫓아온 남성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일을 겪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영국에서는 밖에 나다니기가 정말 어렵다. 때로는 모자를 쓰고 바닥만 너무 많이 봐서 목이 아플 정도"라고 털어놨다.
셀레스 사건 이후 테니스계는 보안을 강화했다. 2023년 WTA는 첫 전담 안전 책임자를 임명했고, AI를 활용해 선수들의 소셜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15건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됐다.
하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그랜드슬램 초기 라운드에서는 주요 스타들도 작은 코트에서 경기를 한다. 체코 선수 이르지 레헤치카는 프랑스오픈에서 맨 앞줄 관중들이 자신의 수건을 잡아당겼다며 "개인 물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테니스를 매혹적인 스포츠로 만드는 본질적 특성을 없애지 않고는 스토커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셀레스는 "30년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내가 겪은 것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셀레스 사건은 32년 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