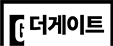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탬파베이의 예상 밖 선전이 메이저리그에 뜻밖의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허리케인으로 홈구장이 파손돼 임시구장을 사용하기로 할 당시엔 생각지도 않았던 포스트시즌 홈경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스포츠매체 디 애슬레틱은 6월 26일(한국시간) "MLB와 탬파베이가 플레이오프 홈경기 장소에 대해 예비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켄 로젠탈 기자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경우 홈경기를 어디서 치를지를 두고 양측이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핵심은 사무국과 구단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다. MLB는 포스트시즌 흥행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더 큰 구장을 선호하는 반면, 탬파베이 입장에선 힘들게 얻은 홈어드밴티지를 포기하고 중립구장을 사용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다.

현재 탬파베이가 사용하는 임시구장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는 뉴욕 양키스의 스프링트레이닝용 구장으로, 수용인원이 1만46명에 불과하다. MLB는 포스트시즌 경기마다 선수와 관계자, 스폰서, 언론 등을 위해 약 7500장의 티켓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좌석의 75%에 달하는 규모다. 로젠탈 기자는 "작은 구장에서는 리그의 각종 의무사항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이다.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면 선수들의 포스트시즌 분배금도 감소한다. 방송사들도 포스트시즌 중계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스타인브레너 필드는 기자석이 29석에 불과하고, 카메라 위치가 낮아 수준 높은 중계방송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탬파베이는 중립구장 사용 시 홈어드밴티지 상실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나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사실상 원정경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딜레마는 처음 임시구장 사용을 결정할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난해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한 탬파베이는 올시즌 개막을 앞두고도 포스트시즌 진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양키스, 보스턴, 볼티모어 등 강팀들이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임시구장을 쓰는 핸디캡까지 안고 가을야구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탬파베이는 예상을 뒤엎고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1위를 달리고 있다. 5월 8일 이후 28승 14패로 메이저리그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이며, 뉴욕 양키스와 동부지구 1위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시즌 시작 전 37.7%였던 플레이오프 확률은 현재 71.2%로 급상승했다.
임시구장 적응도 성공적이다. 초반 11승 18패로 부진했지만 5월 19일 이후 16승 5패를 기록하며 스타인브레너 필드를 진짜 홈구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탬파베이는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50경기 중 42경기가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팬들의 성원을 받고 있다.

결국 양측은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와일드카드와 디비전시리즈는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더 큰 규모가 필요한 리그 챔피언십과 월드시리즈는 다른 구장에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탬파베이가 얻은 홈어드밴티지를 어느 시점에서 포기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로젠탈 기자는 "야구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유명한 탬파베이가 10월 또 다른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다"며 "스프링트레이닝 구장에서 포스트시즌이 열리는 전례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월 복귀 예정인 김하성이 가을야구에서 뛰게 될 구장은 임시구장일까, 아니면 다른 팀의 홈구장일까.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