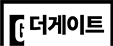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메이저리그(MLB)에 올림픽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시즌 중 국제대회 참가를 꺼려하던 MLB가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만큼은 예외로 두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일정이다. 올림픽 야구가 7월 중순 올스타전과 정면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고민에 빠졌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월 16일(한국시간) 올림픽 야구 경기를 7월 15-20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치른다고 발표했다. 하필 MLB의 중요한 축제인 올스타전과 겹쳤다. 통상 7월 중순에 열리는 올스타전을 피해갈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일정 전체를 뒤흔들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이날 애틀랜타에서 기자들 앞에 섰다. "올림픽 조직위에서 일정을 확정했다니 우리가 맞춰야 한다"고 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야구를 글로벌 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문제 해결의 의욕을 드러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올스타전을 제때 치르고 올림픽까지 소화해도 162경기를 11월 중순 전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물론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는 붙였지만 말이다.
이런 낙관론엔 나름의 근거가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점이다. "해외 대회와 달리 장거리 이동이나 시차 적응 부담이 없다"는 게 사무국의 계산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구단들 생각은 다르다.
정작 선수를 내줘야 하는 구단들은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 시즌 한복판에 에이스나 주력 타자를 2주씩 빼앗길 판이다. 부상이라도 당하면 어쩔 셈인가. 맨프레드 커미셔너도 이런 현실은 안다. "구단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말 큰 일"이라고 토로했다. 말은 쉽지만 설득은 만만찮을 것 같다.
선수노조 반응은 미묘하다. 토니 클라크 선수노조 사무총장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관심 있다"면서도 "해결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했다. 환영하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 애매하다.
클라크 사무총장이 던진 질문들을 들어보면 걱정이 더 큰 듯하다. "메이저리거가 참가하면 어떤 모습일까? 참가 못 하는 선수들은 어쩌나?"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와 못 나가는 선수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실무 문제는 더 복잡하다. "일정 조정은 어떻게 하고, 이동·지원은 누가 책임질까? 보험은?" 클라크 사무총장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올림픽에서 다치면 누구 탓인가. 항공료는 누가 내나.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다.
그래도 선수노조는 문을 열어뒀다. "야구 발전을 위해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게 클라크 사무총장의 마지막 말이었다. 조건만 맞으면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FOX와의 올스타전 중계 계약 문제가 남았다. 올스타전을 뒤로 미루거나 올림픽과 겹치게 하면 중계료와 광고 수익이 타격을 입는다. 결국은 다 돈 문제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조직위가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건 결국 30개 구단 손에 달렸다. 각 구단은 저울질이 복잡하다. 선수들의 부상 위험, 팀 성적에 미칠 영향, 수익 변동까지 계산해야 한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다투는 팀일수록 핵심 선수를 뺏기는 걸 반길 리 없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16일 올림픽 조직위와 만났다고 했다.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몇 달간 MLB와 선수노조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성사되면 한국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 김혜성(LA 다저스) 같은 메이저리거들을 대표팀에 부를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미국의 애런 저지 같은 괴물들과 맞붙어야 하니 메달 경쟁은 훨씬 치열해질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