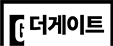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올스타 주간이 끝나고 메이저리그 프런트 오피스들이 다시 바빠졌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문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 시한을 뒤로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화제다.
칼럼니스트 짐 보우덴이 7월 18일(한국시간)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을 통해 제기한 문제다. 16년간 메이저리그 단장을 지낸 그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8월 15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7월 31일 오후 6시(동부시간)로 설정된 마감 시한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보우덴이 양대 리그 수십 명의 단장과 야구운영 사장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현 시점 유지, 뒤로 미루기, 심지어 올스타 주간으로 앞당기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존 모젤리악 야구운영 사장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데이브 돔브로스키 사장도 8월 15일 연기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신시내티 레즈 닉 크롤 사장은 회의적이었다. "이동시키자는 주장도, 현재대로 두자는 주장도 모두 이해한다. 하지만 시한을 늦추면 파는 팀들이 그냥 더 오래 기다릴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상 유지가 맞다고 본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차기 단체협약 협상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어차피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보우덴이 제시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나름 설득력이 없지 않다.
첫째, 2021년부터 신인 드래프트가 6월에서 7월 올스타 주간으로 옮겨졌다. TV 중계 효과 등을 노린 변화는 성공적이었지만, 프런트 오피스들은 드래프트 준비에 매달리느라 트레이드 논의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다. 드래프트가 끝나고 데드라인까지 겨우 2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둘째, 2022년 포스트시즌 진출 팀이 12개로 확대되면서 '사는 팀'은 늘고 '파는 팀'은 줄었다. 2주 더 늦추면 경쟁에서 탈락한 팀들이 더 많아져 매물이 풍부해진다.
셋째, 2019년 8월 웨이버 트레이드가 폐지되면서 8월 초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한 팀들이 속수무책이 됐다. 그때가 되면 마이너리그 선수나 방출선수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넷째, 작년처럼 파는 팀이 적으면 '셀러스 마켓'이 형성돼 마이너리그 팜이 좋은 팀들만 좋은 선수를 가져간다. 데드라인을 늦추면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
다섯째, 8월 중순까지 트레이드 관심이 이어지면 NFL 훈련캠프 시작으로 다른 종목에 관심이 분산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반대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올스타 주간으로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다. 신인드래프트와 트레이드를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것이다. 아예 지명권 트레이드까지 허용하면 거대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후 8월 중순까지는 제한적 트레이드만 허용하고, 과거 웨이버 트레이드 방식을 부활시키자는 대안도 나왔다. 2017년 저스틴 벌랜더가 8월 31일 디트로이트에서 휴스턴으로 이적해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모두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다. 강팀들은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약팀들은 "어차피 팔 거면 빨리 팔고 리빌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리그 차원에서는 데드라인을 늦출 경우 관심의 지속이라는 분명한 매력이 있다. NFL이 본격 시동을 거는 8월 말까지 야구 스포트라이트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쁠 게 없다. 팬들도 더 오래 트레이드 드라마를 즐길 수 있고.
결국 보우덴의 제안이 현실이 될지는 차기 단체협약 협상에서 판가름난다. 선수노조와 구단주들, 그리고 리그 사무국이 각자의 셈법을 들고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분명한 건, 그때까지 트레이드 마감일은 7월 31일이고 남은 2주 동안 다양한 드라마가 펼쳐질 거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