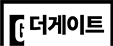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리그 확장과 재배치를 공식 언급하면서 MLB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32개 팀 체제로 가려면 재편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130년 역사를 가진 리그를 어떻게 뜯어고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지난 18일(한국시간) "확장과 재편성은 내 머릿속에서 연결돼 있다"며 "선수들의 이동 부담을 크게 줄이고, 포스트시즌 편성도 방송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말은 쉽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세 가지 핵심 딜레마가 MLB를 옥죄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130년 넘게 이어진 라이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는 1889년부터 맞붙어온 숙적이다.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그랜트 브리스비 기자는 이 둘의 분리를 "협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단언했다. 양키스-레드삭스, 컵스-카디널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리그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보스턴과 LA 에인절스가 밤 10시에 맞붙으면 동서부 팬들 중 절반은 제대로 경기를 볼 수 없다. 방송사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FOX나 애플티비 플러스가 원하는 건 전통이 아니라 시청률이다. 결국 130년 역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효율성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지역별 재편성도 양날의 검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팀들을 묶으면 이동거리는 줄어들지만, 경쟁력 면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내셔널리그 남부지구를 신설해서 애틀랜타, 마이애미, 탬파베이, 그리고 확장팀을 배치하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마이애미와 탬파베이는 MLB에서 가장 인기 없는 팀들로 악명 높다. 여기에 확장팀까지 더해지면 야구 역사상 가장 관중 동원력이 떨어지는 지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성은 만족시켰지만 상업적으로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인기팀들을 한 지구에 몰아넣으면 치열한 경쟁은 보장되지만 다른 지구와 양극화를 피할 수 없다.

확장팀 도시 선정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 후보지 중 하나인 솔트레이크시티는 인구가 오클랜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브리스비 기자는 "형편없는 구단주 하나만 있어도 애슬레틱스보다 10배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틀랜드는 그나마 현실성 있는 도시로 통하지만, 실제론 구장 건설을 거부하는 지역을 겁주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
무엇보다 경제적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B로 시작하는 숫자"라고 표현한 확장팀 가입비는 10억 달러(1조4000억원) 이상을 의미한다.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도시가 과연 몇 개나 될까? 내슈빌, 포틀랜드, 솔트레이크시티 정도로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재편성은 불가능하다. 전통을 지키자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성을 추구하자니 경쟁력이 약화된다. 그나마 절충안은 디 애슬레틱의 스티븐 네스빗 기자가 제안한 것처럼 콜로라도 로키스만 아메리칸리그로 보내고 나머지 전통적 라이벌 관계는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이나, 이 역시도 완벽하진 않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2029년 임기 만료 전 확장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시간은 4년도 안 남았다. 130년 역사를 가진 리그의 대수술을 앞두고, MLB는 결국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지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