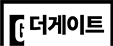[스포츠춘추]
과거 프리미어리그엔 지역 균형이란 게 있었다. 1992년 창설 당시 북부와 런던의 세력 균형이 비교적 맞춰져 있었던 시절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명백히 '런던 리그'가 되어가고 있다.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축구장 밖에서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팀 스피어스 기자는 26일(한국시간) 기사에서 "런던과 잉글랜드 나머지 지역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런던 지역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33% 높고, 일부 북서부 도시보다 68%나 차이 나는 현실이 축구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숫자가 이런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런던 클럽 7개, 남부 클럽 3개(사우샘프턴, 본머스, 브라이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북부 클럽은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저인 5개에 불과했다.
이는 창설 당시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다. 1992-93시즌에는 북부 클럽이 10개, 런던·남부 클럽이 7개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88년 첫 풋볼리그 12개 클럽은 모두 미들랜즈 이북 지역이었다. 당시 가장 남쪽 팀인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과 아스톤 빌라의 연고지는 여전히 영국 산업 중심지였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런던 클럽들이 프리미어리그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웨스트햄, 풀럼, 크리스털 팰리스는 이제 상위권 단골손님이 됐다. 최근 몇 년 사이 브렌트포드와 남해안의 브라이튼까지 합류하면서 남쪽 세력은 더욱 탄탄해졌다.
이런 변화의 근본 원인은 해외 선수들의 런던 선호 현상에 있다. 스피어스 기자는 "외국 선수들은 영국의 수도에 거주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리그로 유입되는 선수의 대부분이 해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직 스포팅 디렉터는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다. "해외 선수들을 상대할 때 '런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 선수가 런던 클럽을 원한다는 말을 꽤 자주 듣는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런던이 곧 잉글랜드 자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남미나 아시아에서 온 20세 선수를 영입하려 하면, 이들에게 런던은 곧 잉글랜드나 마찬가지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선수들은 화려한 밤문화와 할 거리가 많은 것에 매력을 느낀다." 물론 가족이 있는 선수들은 좀 더 조용한 동네, 녹지 공간이 많은 곳을 선호하지만, 지리적 요인이 강력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리미어리그의 해외 선수 비율 변화가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트랜스퍼마켓에 따르면 1992-93시즌 프리미어리그 22개 클럽의 영구 이적 118건 중 영국과 아일랜드 외 출신은 단 13명(11%)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토트넘은 여름 이적에서 영입한 6명을 모두 영국인으로 채웠다. 에릭 칸토나가 리즈에서 맨유로 이적한 것도 '영국 내 이적'으로 분류됐을 정도다.
그런데 올 여름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119건의 영구 이적 중 영국·아일랜드 국적 선수는 31명에 그쳤다. 에베레치 에제, 조던 헨더슨, 노니 마두에케, 리암 델랍, 제임스 트래포드 등이 포함된 이 숫자는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나머지 74%가 해외 출신이라는 뜻이다.
해외 선수들의 런던 쏠림 현상은 실제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스피어스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평균 순위는 3.88위로, 프리미어리그 이전 33시즌 평균인 7.3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첼시의 변신은 더욱 극적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평균 4.85위를 기록한 첼시는 이전 30여 년간 평균 15.8위에 머물렀던 클럽이었다.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 클럽이 어느새 유럽 강호로 탈바꿈한 것이다.
토트넘(8.2위→7.7위), 웨스트햄(15.5위→13위)도 상승세를 보였고, 브렌트포드, 풀럼, 크리스털 팰리스는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뒀다.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인 브라이턴의 약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반면 북부 클럽들의 고전은 처절하다. 런던에서 450km 떨어진 최북단 클럽 뉴캐슬이 대표적 피해자다. 올 여름 주앙 페드루가 뉴캐슬 대신 첼시를 선택한 것이 모든 걸 말해준다. 전 브라이턴 동료 이고르 줄리우는 "페드루는 항상 런던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며 "런던 클럽 제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축구적 조건이 아니라 거주지 선호가 이적을 결정한 셈이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1990년대 파우스티노 아스피야 영입기였다. 당시 프레디 셰퍼드 뉴캐슬 회장의 회상이 생생하다. "아스피야의 에이전트가 '뉴캐슬이 런던 어느 지역에 있냐'고 물었다. 우리는 그냥 '멀지 않다'고 둘러댔다." 450km나 떨어진 뉴캐슬을 런던 근처라고 속여서라도 선수를 잡으려 했던 절박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케빈 키건 전 감독도 롭 리 영입 과정에서 "런던에서 뉴캐슬까지 가는 게 미들스브러에서 가는 것보다 빠르다"는 황당한 논리로 설득에 나섰던 일화가 유명하다.

런던 클럽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런던'을 마케팅 무기로 사용한다. 첼시는 지난 시즌 'CFC LDN' 브랜딩을 도입했고, 아스널은 홈경기마다 '노스 런던 포에버'를 외친다. 웨스트햄은 2016년 런던 스타디움으로 이전하면서 클럽 엠블럼에 아예 '런던'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런던 클럽들의 시즌티켓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싸다. 풀럼, 토트넘, 아스널, 웨스트햄이 최고가 상위권을 독점한다. 이는 수익으로 직결돼 아스널, 첼시, 토트넘, 웨스트햄이 모두 유럽 최고 수익 17위 안에 포함됐다.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담당하는 한 에이전트는 "협상 시작점이나 마지막 결정 시점에 런던이 자주 화제가 된다"며 "비슷한 규모의 클럽 중 하나가 런던에 있다면 분명히 고려 요소가 된다"고 증언했다.
물론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 같은 절대 강자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힘 앞에서는 지역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위권 이하에서는 런던 효과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에디 하우 현 뉴캐슬 감독이 지난 5월 "그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강변했지만, 올 여름 참담한 이적시장 결과가 현실을 보여줬다.
남쪽으로의 축구 권력 이동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처럼 보인다. 닐 워녹의 직설적인 표현이 모든 걸 요약한다. "우리는 런던에 있다. 그게 바로 그 빌어먹을 차이점이다."